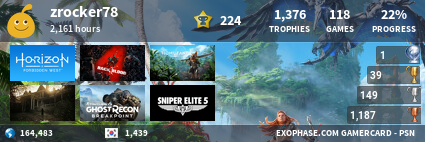- 개인 포트폴리오
- 개인홈페이지
- 준휘맘의 하루하루
- 맥가:Analog Design+ : 네이버 블로그
- PanchokWorkshop
- 뷰파인더 속 큰세상
- 여행은 푸르다
- PSNProfiles - PS4 Trophies, PS…
- 김박사의 연구실
- 비주얼스트랩
- 캠핑&보트 낚시
- Denim Powell 섶퉤어 개발기
- 시골청년의 블로그 이야기
- JRPG by JKim
- 코드테스트
- 구글 애드센스
- 고전게임 크래쉬
- getmemp3
- 한글패치_아루미
- 샬롯! 당신이 차에 치였다고 전화가 왔어!
- 반응형웹 스타일 가이드
- slowalk
- 게임롬 다운로드
- Team.SM with NICALiS
- 게임롬 다운로드
- UI, heeyeun
- 한마루의 게임 이야기
- 텐핑, 소문내기!
- Facebook Design | What's on ou…
- Melanie Daveid - UX Design & A…
- Digital Insight Today, 디아이투데이
- 씨디맨의 컴퓨터 이야기
Macga:1980
설득에 의한, 설득을 위한 디자인. 본문
걱정이라는 감정을 기대로 억누르며 대표실의 문을 엽니다. 지난 며칠간 나 그리고 사무실의 모든 직원의 머리를 복잡하게 한 연봉협상. 바로 오늘입니다. 대기업처럼 규모가 있어 연봉 테이블이 정해진 상태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겪은 대부분의 실무는 늘 오늘과 같았습니다.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살피는 대표의 눈을 응시합니다. 일부러 당당한척 꾸부정해진 허리도 곧추세웁니다. 사실 나를 바라보는 대표의 초점이 나를 향하는 건지 나 아닌 어딘가를 향하는 건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 감정조차 읽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설립된 이래 지난 몇 년간 나를 포함,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온 자입니다. 지지 않으려 먼저 입을 뗍니다.
"제가 마지막인가요?"
"응? 그게 중요한가? 자 바쁠 텐데 후딱 끝내고 일하러 가야지?"
"하하! 많이 피곤해 보이시길래, 내년엔 제가 1등으로 와야겠습니다."
"허허 내년에도 있어줄라고? 작년에 얼마 올려줬지?"
- 생략.
몇십 분간 제가 대표에게 던진 말들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저에게 박힙니다. 힘껏 털어내도 떨어지지 않는 단점이 되어 주렁주렁 붙습니다. 게다가 사람 말을 어찌 이리도 잘 흘리는지... 국내 태극권 고수가 있다면 아마도 이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가장 중요했던 '설득'은 그렇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모! 멍게 싱싱해요?"
"아이고~ 말해 뭐해 오늘 아침에 들어온겨! 싸게줄랑께 어여 가져가"
세상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엔 늘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팔며 흥정할 때,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교육 과정 중에도, 다투고 화해하는 그 끝에도 말이죠. 우리가 일하는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자가 나를 설득하고 내가 다시 기획자를 설득하고, 나의 디자인이 결국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설득에 의한 설득을 위한. 허나 꼭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누군가를 깍아내리거나, 어떤 약점 같은 것을 잡아 상대방을 흔들기도 합니다.

설득의 핵심 원소. 바로 말빨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안에서 이 말빨이라는 원소를 가장 잘 지니고 있는 게 바로 기획자라는 집단일 겁니다. 간혹 기획서를 거지 발 싸게처럼 써오는데 희한하게도 클라이언트 컨펌은 기똥차게 받아오는 인물을 만납니다. 기회가 되어 그런 기획자가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는걸 유심히 지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군 이래 이놈 같은 사기꾼이 또 있을까?'
저는 분명 별 다른 기획의도 없이 단순히 이뻐서한 디자인인데 제멋대로 해석해가며 클라이언트를 설득합니다.
"다 좋은데 이거 색깔이 좀..."
"아이고, 사장님. 펜톤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물론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펜톤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선정한 올해의 컬러예요. 자 보세요. 울트라 바이올렛. 저희 디자이너가 이 울트라 바이올렛에 사장님 기업 색깔을 살짝 가미해 커스터마이징한 컬러에요. 아주 유니크한 거라고요."
어떻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리 말을 뱉을 수 있는 건지... 미팅을 끝내고 나오며 물어봅니다. 어찌 그리하냐고.
"디자이너인 니들도 이 색 넣어보고 배치 이리저리 해보고 여러 디자인적인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작업하지 않냐? 나 역시 클라이언트 놈들이 뱉을 말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고 입을 연다."
함께 일하며 치가 떨리게 미웠던 놈인데 오늘따라 조금 이뻐 보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사실 작업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위 케이스처럼 나의 방패가 되어줄 든든한 기획자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이 늘 그렇지 못합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사무실의 디알못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나의 디자인을 물어뜯습니다. 대한민국 일터는 사장님들의 '킹덤'이거든요. 그렇게 뜯기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패가 없으니 내가 검이 될까?'
이제부터는 수비가 아닌 공격입니다. 먼저 베는 겁니다. 잡설에 가까운 온갖 피드백 다 베어버립니다. 디자인적 이론, 인문, 심리, 통계 등. 내 디자인이 올바른 것임을 증명할 단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나의 검을 단단하고 예리하게 합니다. 연차가 쌓임에 따라 그런 단서들은 머릿속 깊숙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갑니다.
"어찌해드릴까요?"가 아닌 "이렇게 해줄까"로 시작하는 겁니다. 전문가니까요. 작업을 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사려 깊다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상대방에게 비전문가적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서를 많이 요구할 수도록 나의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칩니다.
그들도 알지 못해 전문가인 우리에게 의뢰한 것이니, 우리 쪽에서 리드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과 을, 고용과 피고용을 떠나, 합당한 비용을 받고 디자인적 솔루션과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디자인에 임했으면 합니다. 설득할 준비를 하세요. "디자인 왜 이렇게 했어?"라는 질문에 "이쁘잖아요"라는 못난 대답은 좀 아니지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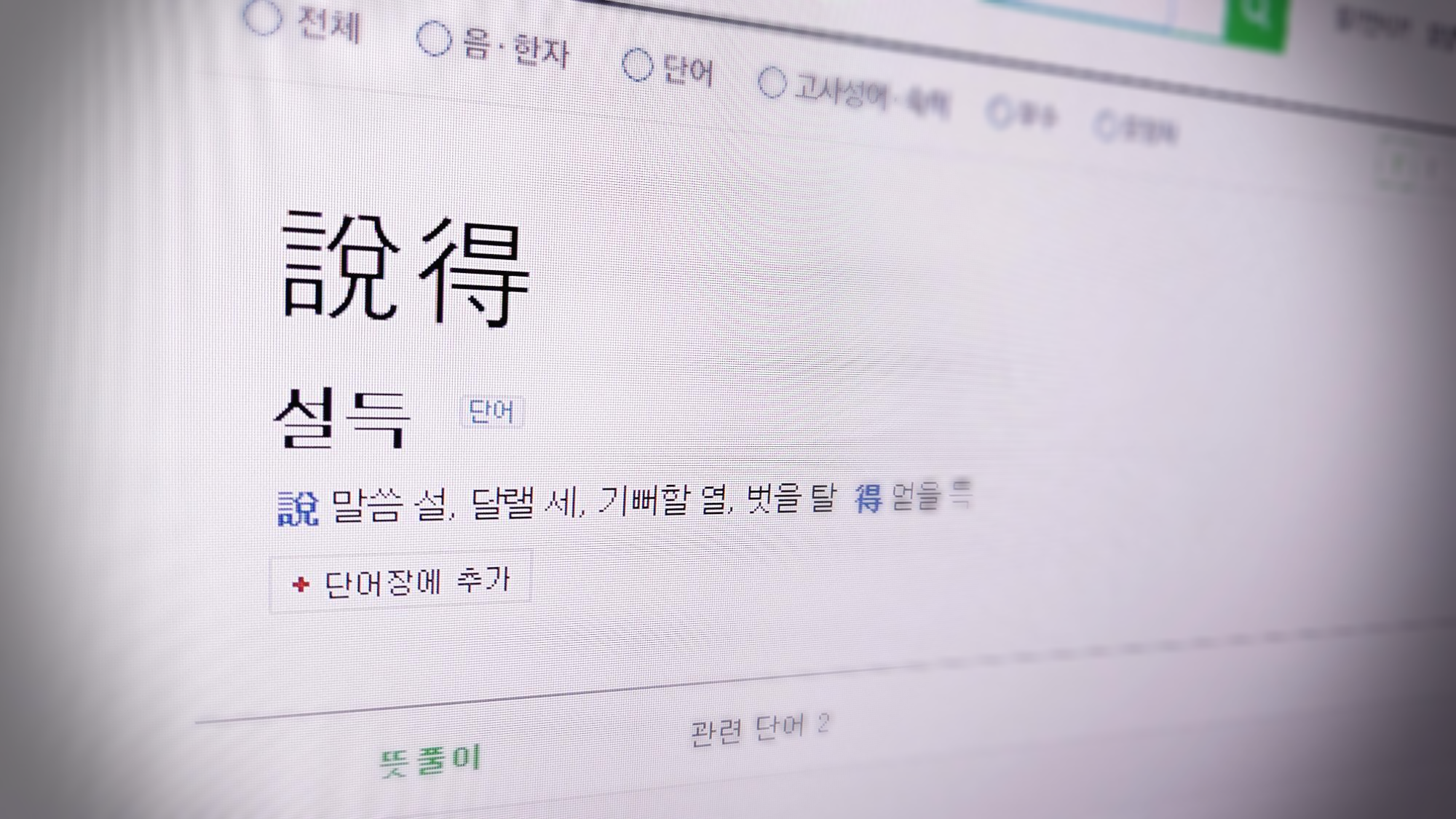
얼마 전 자주 가던 카페에서 꽤나 인상 깊은 댓글을 봤습니다. 디자이너 포트폴리오에 관한 글이었는데 누군가 포폴에 대한 정의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 주었더군요.
"기업에 입사함에 있어 나를 증명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 업종은 포트폴리오가 가장 효과적인 증명 방식이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이상으로 정의할 문장이 있을까요? 디자인은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득의 수단인 겁니다. 흠 없이 단단한 디자인을 하세요. 설득에 의한 디자인이 아니라 설득을 위한 디자인을 하세요. 그리해야 전문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길고 쓰잘대기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로티(Lottie)를 이용한 앱 애니메이션 구현하기, 마이크로 인터랙션 (5) | 2020.04.21 |
|---|---|
| 웹디자인, 초심자를 위한 광고 배너 훑어보기 (0) | 2020.04.14 |
| 웹디자인, 우리는 그간 무엇을 배웠을까? (10) | 2020.03.22 |
| UI/UX디자인 초심자를 위한 웹 그리드 시스템 훑어보기 (3) | 2020.03.17 |
| 바보짓도 계속하면 정체성이 된다 - 아이덴티티 이야기 (0) | 2020.03.09 |